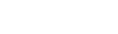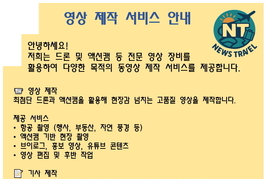-

[세계 7대 불가사의 기획⑦] 왜 인간은 신의 형상을 세웠는가 – 구세주 그리스도상
[뉴스트래블=정국환 기자] 도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올려다본다. 성당의 첨탑, 왕궁의 돔, 언덕 위의 성채. 인간은 오래전부터 가장 높은 곳에 상징을 세워왔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믿는 가치와 시대의 방향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산 정상에 서 있는 거대한 조각상도 그 계보 위에 있다.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상이다. 이 조각상은 해발 약 700미터의 코르코바두 산 정상에 서 있다. 양팔을 넓게 펼친 모습은 마치 도시 전체를 감싸 안는 듯하다. 높이 약 30미터의 석상과 그 아래 받침대를 합치면 38미터에 이른다. 1931년 완공된 이 작품은 이제 브라질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다. 해안과 산, 그리고 도시가 겹쳐지는 풍경 속에서 그리스도상은 리우의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다. 조각상이 세워진 시기는 브라질 사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던 시기였다. 공화국 체제가 자리 잡아가던 20세기 초, 가톨릭 교회와 시민 사회는 도시를 대표할 상징을 구상했다. 그 결과 선택된 것은 신앙의 상징이었다. 조각상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신의 형상이 도시의 상징이 된 것이다. 건축과 조각은 기술의
-

[NT 기획] 데이터로 그리는 2026 관광 지도 ③
[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즐거운 여행의 마침표는 결국 '무사귀환'이다. 하지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이나 좁은 골목길의 관광지에서 안전은 늘 불안한 숙제였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지는 단순히 즐거운 곳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놀이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0.1초의 데이터가 생명을 구한다…실시간 ‘안전 컨트롤타워’ 한국관광공사가 정립한 혼잡도 관리 체계의 정점은 '실시간 대응 거버넌스'에 있다. 관광지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와 지능형 CCTV는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다. 인파의 밀집도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 군집의 흐름을 초단위로 분석한다. 만약 특정 구역의 밀도가 '심각' 단계에 진입하면, 시스템은 즉각 비상 모드로 전환된다. 현장 운영 요원의 스마트폰에는 진동 알람이 울리고, 지자체 상황실과 인근 경찰·소방서에는 실시간 현장 영상이 공유된다. 과거 사고가 터진 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가 위험을 먼저 인지하고 구조대를 호출하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 "통제가 아닌 보호"…현장에서 만나는 첨단 안전 기술 현장 대응 방식도 진화한다. 단순히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과
-

[NT 기획] 데이터로 그리는 2026 관광 지도 ②
[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한때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나 제주도의 유명 마을들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몸살을 앓았다. "우리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니다"라며 호소하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관광 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하지만 2026년, 첨단 혼잡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갈등의 현장이 '상생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관광객의 발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흐름'을 조절하자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 "더 이상 대문 앞이 시끄럽지 않아요"…거주권 지키는 데이터의 힘 한국관광공사의 새로운 매뉴얼은 관광지의 수용 능력을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특정 골목이나 주거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조짐이 보이면 인근 안내 요원에게 즉각 알람이 전송된다. 과거에는 인파가 몰린 후에야 통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 단계에서부터 진입 속도를 늦추거나 인근의 다른 명소로 동선을 유도한다. 소음과 쓰레기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불규칙하게 쏟아지던 인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니 동네가 훨씬 정돈된 느낌"이라며 반기고 있다
-

[NT 기획] 데이터로 그리는 2026 관광 지도 ①
[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 직장인 A씨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큰마음을 먹고 유명 관광지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주차장 진입에만 1시간이 걸렸고, 소문난 맛집과 포토존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줄이 늘어서 있었다. 결국 A씨 가족은 사람 구경만 하다 지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풍경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인파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현장에 첨단 데이터 기술이 전면 도입되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는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듯 관광지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떠나는 '스마트 여행'이 일상이 된다. ◇ AI가 그리는 '관광 예보'…"붐비는 시간 피해서 가세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한 관광지 혼잡도 운영 관리 매뉴얼'의 핵심은 머신러닝 기반의 '사전 예측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과거 수년간의 방문객 방문 패턴, 요일별 특성, 날씨 정보, 그리고 실시간 통신·교통 데이터를 결합해 관광지의 미래 혼잡도를 예측한다. 여행객은 방문 전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관광지의 혼잡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일 오후 2시는 '경계' 단계이니
-

[NT 기획|국가별 방한 리포트] 한국을 찾는 몽골인의 여행법
[뉴스트래블=박민영 기자] 한국을 찾는 몽골인 여행객의 일정표에는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조금 다른 첫 장면이 등장한다. 호텔 조식이나 관광지 방문이 아니라 병원 예약이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침 일찍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은 뒤 쇼핑이나 관광 일정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한국 여행이 관광과 의료 방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시장이 바로 몽골이다. 몽골과 한국의 거리는 비교적 가깝지만 의료 환경과 관광 인프라의 차이는 크다. 이 때문에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단순한 여행 목적지가 아니라 치료와 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된다. 한국관광공사의 국가별 방한 관광시장 분석에서도 몽골은 의료 관광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되며, 실제 방한 목적에서도 치료와 건강검진 관련 수요가 꾸준히 나타난다. 병원을 중심으로 짜인 여행 일정 몽골인 관광객의 한국 일정은 병원 방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이나 전문 진료, 치과 치료 등을 예약한 뒤 그 사이 시간에 관광을 하는 방식이다. 진료가 끝난 오후에는 쇼핑이나 외식, 관광지를 찾는 일정이 이어진다. 서울 강남 일대나 대형 병원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몽골어 안내를 쉽게
- 1[NT 심층 기획①] 한국인이 '한 달 살기' 좋은 나라 Top10
- 2인천 영종국제도시, 18일 ‘영종 불꽃 페스타’ 개최
- 3[NT 특집]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는?...2025 최신 안전 지수
- 4[NT 사설] 제주항공, 값싼 항공권의 값비싼 배신
- 5[NT 기획] 중국, 하늘길 재편 선언…보잉 500대 구매가 촉발할 관광산업의 지각변동
- 6[안산 12경 비화] 1경 시화호…죽음의 호수'가 낳은 세계 1위 에너지 K-미스터리
- 7[안산 12경 비화] 7경 안산갈대습지…'죽음의 호수'에서 피어난 생명 복원의 K-미스터리
- 8[NT 심층 기획②] 포르투갈, 유럽에서 가장 ‘한 달 살기’ 좋은 나라
- 9[NT 통찰] 그날, 미국은 한국인을 가뒀다
- 10[NT 칼럼] 한국 골프, 세계 최고인가 세계 최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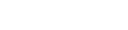

![[세계 7대 불가사의 기획⑦] 왜 인간은 신의 형상을 세웠는가 – 구세주 그리스도상](http://www.newstravel.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4072518685_6d92e3_575x383_c0.png)
![[NT 기획] 데이터로 그리는 2026 관광 지도 ①](http://www.newstravel.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3172728174_295a2c_575x383_c0.jpg)